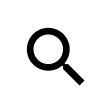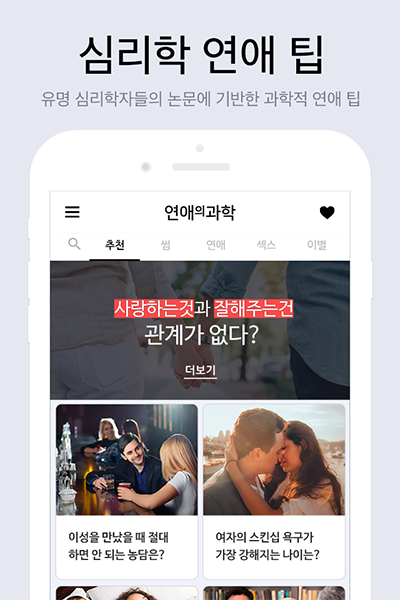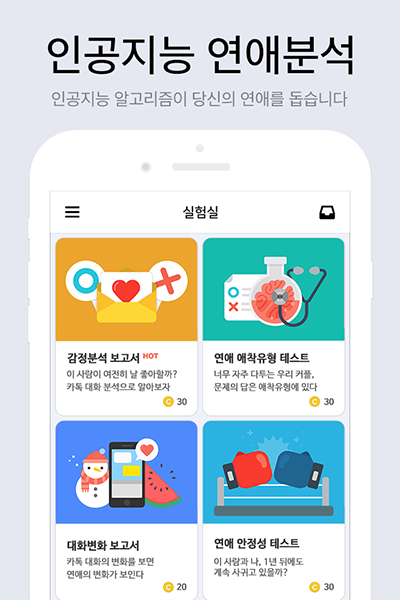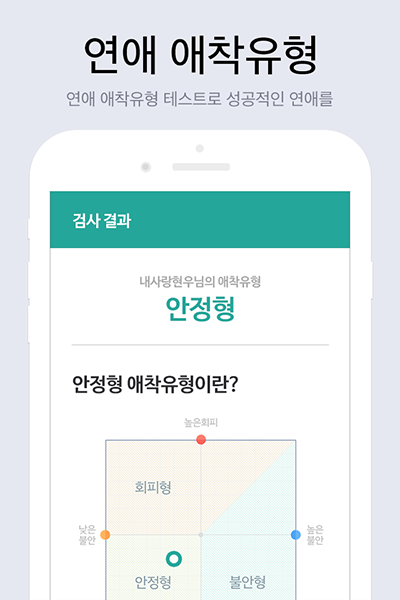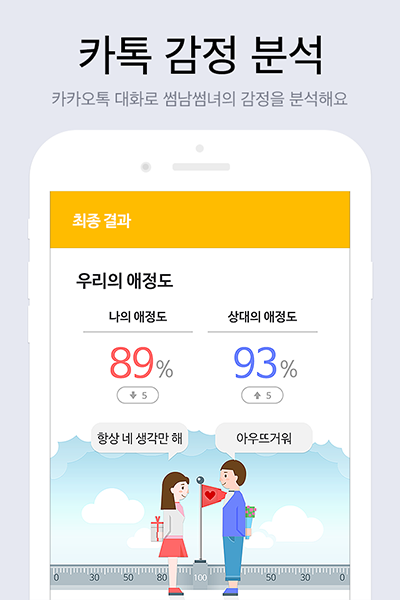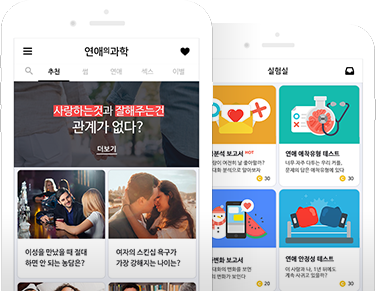남편과 나는 소위 ‘운명적으로’ 만났다.
뉴욕으로 이사오기 전,
오클랜드에 살고 있던 때였다.
다운타운의 <Layover>라는 후미진 바에서
나는 그를 처음 보았다.
같이 바에 간 친구가
가서 저 사람하고 춤도 추고,
맥주도 한 잔 얻어먹으라며 귀띔했다.
“He’s a Korean too, you know.”
내가 데이트 상대로
한국인만을 고집한다고 넘겨짚은 친구는
비밀스러운 정보라도 주는 듯이 속삭였다.
“He’s also a musician.”
친구가 턱으로 가리키는
바 쪽을 쳐다봤더니,
턱수염이 얼굴을 까맣게 덮은
덩치 큰 동양 남자가
신이 나서 웃고 있었다.
나는 마시던 맥주를 원샷하고 말했다.
“Le’ts get out of here.
I don’t date musicians.”
그게 그의 첫인상이었다.
부모님 차고에서
혼자 음악만 듣고 있을 것 같은
성공 못 한 예술가.
32살의 나이에
이름 모를 뮤지션과 데이트를 시작하기엔
나는 제법 속물이었다.

그 후로 한 달 쯤 지났을까,
한국계 미국인인 친구 제니퍼가
케이크를 사 들고 집에 놀러 왔다.
케이크를 먹으면서
수다를 떨다가 그녀가 물었다.
“언니, 근데 언니는
왜 남자 친구를 안 사귀어?”
“안 사귀는 게 아니고 없는 거야.
나도 사귀고 싶지!”
“언니 그러면
I know a perfect guy for you!”
그 남자 좀 아티스틱하고,
성격도 좋아 보이고, 남자답고..
돈도 그럭저럭 버는 것 같아. 키도 커!”
“그래? 좋아! 만나볼래!”
“근데 한가지….. 다 좋은데,
그 사람 다 좋은데.
머리가 없어. 완전 스킨헤드야.”
“나는 사람 외모 별로 안따지는데..
대머리는 좀 그래.
뚱뚱하거나 키 작은 건 괜찮지만.
대머리는 잘 모르겠어.
그냥 패스할래.”
그렇게 별다른 기억이 없는
몇 주가 또 지나갔다.
한창 무료해하던 차에
친구들이 집 근처에서 열린다는
할로윈 파티에 나를 데려갔다.
불행히도 파티는 재미있지 않았다.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만
크게 한 스쿱 퍼서 먹고 있는데
웬 머리를 빡빡 깎은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이전에 바에서 봤던
그 새까만 수염의 남자였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제니퍼가 내게 소개시켜주고 싶다던
그 아티스틱한 스킨헤드였다.
그렇게 세 번의 스쳐 감 끝에
그를 '처음' 만났다.
우린 아이스크림과 맥주를 나눠 먹다가
전화번호를 주고받았고,
월요일 아침에 그가 문자를 보냈다.
"저녁에 맥주 한잔해요"
맥주를 마시면서
만나는 남자가 있냐고
자꾸만 돌려 묻길래,
요즘 남자들은 간이 쪼끄맣다.
맘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냥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고
간 보고 떠보고.
그런 게 재미없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내일 저녁에 우리 둘이
소주 한잔할까?"
라고 그가 바로 물었다.
화요일, 동네 한국식 술집에 가서
콘치즈와 떡볶이를 시켜놓고
몇시간씩 대화했다.
사랑에 대해, 음악에 대해, 예술에 대해.
수요일에는 아침부터 만나
하루를 통째로 함께 보냈다.
버클리 일대의 카페에서
그는 자기 노트북을 켜놓고 일을 하고
나는 스케치를 하거나 책을 읽었다.
집에 가기 전엔 모교 교정에서 보는
노을을 보여준다고 해서
학교 안 가장 높은 계단에서
새빨간 노을을 함께 보았다.

우린 목요일에도 만났다.
그는 나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고 했다.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면서.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안계신..
90살 가까이 된 할아버지가 피아노를 치는
낡고 허름한 피아노 바에 데려갔다.
그는 나를 무대 앞자리에 앉혀놓고
Frank Sinatra의
<The way you look tonight>을 불러주었다.
Some day, when I'm awfully low
When the world is cold
I will feel a glow just thinking of you
And the way you look tonight
Mm, mm, mm, mm,
Just the way you look tonight.
어두운 밤하늘 속에서
번쩍이는 별똥별만큼,
우린 빠르고 강렬하게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기적이 내게도 존재하다니.
그는 나를 20살에 만나지 못한 것이
원통하다고 했다.
"인간의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 거라면,
너를 십 년이라도
더 먼저 알았다면 좋았을 거야."
그는 어느 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의 집 앞 호수에 떠 있는
곤돌라를 타보자고 했다.
늘 궁금했던 터라
그의 손을 붙잡고 곤돌라에 올랐다.

하늘이 흐리고 찌뿌둥한 날씨였다.
곤돌라에는 붉은 롱스템 로즈 한 다발과
샴페인이 있었다.
그가 샴페인을 뽕하고 따더니
씩 웃으면서 말했다.
“비싸서 이걸로 샀어.”
손을 살짝 떨면서
꼴꼴꼴 샴페인을 따르는 그의 손을 보고
이미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는 샴페인을 건넨 후
주머니를 뒤적거려 반지를 꺼냈다.
평생을 함께하잔 얘기였다.
울지 않을 줄 알았는데 눈물이 터졌다.
그러자 곤돌라를 밀던 뱃사공이
갑자기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
호숫가를 지나가던 홈리스도
끌고 가던 카트를 세워놓고
큰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했다.
곁을 지나던 곤돌라에 탄 사람들도,
호수가를 산책하던 사람들도,
모두 노래를 따라 부르며 박수를 쳐줬다.
나는 울다가 웃기를 반복했다.
행복의 절정이었다.

그렇게 꿈같은 연애와 프로포즈,
화려한 결혼식이 지나갔다.
하지만 그 후로 지난 몇 년 간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분명 즐거운 날들도 많았지만
우린 정말 많이 싸우고
정말 많이 울고,
수백 번도 더 절망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거나
감정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싸울 때마다 ‘평생’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부분을 양보하면
나는 평생 이걸 양보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
지금 이걸 내주었다가
평생 돌려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평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그것을 약속할 때의 달콤함보다
훨씬 무거웠다.
가끔 친구들이 내게 묻는다.
그래서 그토록 뜨겁고
애틋하던
그 사랑이 이제 다 사라졌느냐,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너도
남편이 지긋지긋하더냐, 라고.
그럼 나는 대답한다.
Yes and No, 라고.
사랑은 마치 유기체처럼
계속해서 자라나고
겉모습도 달라진다.
한때는
16부작 로맨틱 코메디였던 것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일 드라마로 바뀌는 게 결혼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고도
또 두려워하는,
현실이고 일상이다.
그래서 지긋지긋하고
그래서 사랑스럽다.
[실전 결혼] 시리즈
"결혼은 결코 로맨틱하지 않다!"
아티스트 심지아. 그녀가 결혼 생활 속에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가감 없이 전해 드립니다. 누군가의 솔직한 결혼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린 연애와 결혼에 대한 많은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실전 결혼>은 매주 토요일 저녁 연재됩니다.
(편집: 김관유 에디터)
필자: 심지아
결혼 6년차, 엄마 3년차, 인간 40년차.